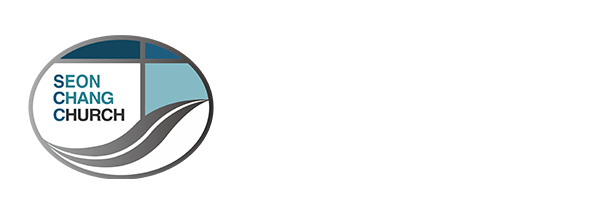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. 신앙의 타락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. 오늘 본문은 언제 우리에게 신앙의 타락이 오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
먼저,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누리지 못할 때 신앙의 타락이 옵니다. (1-9절)
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.
19장도 1절에서 ‘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’는 말로 시작합니다. 그 다음 말이 필요하지만 굳이 그 다음 말을 적지 않아도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은 레위인입니다. 레위인이란 말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.
먼저 1절에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고 말합니다. 레위인은 이 여인에게 3절에 보면 남편이었으면서도,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. 레위인이 이런 첩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. 더 나아가 레위인과 그의 첩과의 관계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2절에 보면 ‘그 첩이 행음하였다’고 말합니다. 그리고 ‘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갑니다.’ 이 레위인은 넉달 동안을 기다립니다. 그러다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. 5일을 머물다가 드디어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레위인입니다. 레위인도, 그 첩도, 그 아버지도 모두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
또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할 때 신앙의 타락이 옵니다. (10-30절)
다섯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길을 떠납니다. 가장 가까운 성은 여부스입니다. 여부스는 원래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어야 하지만 실패함으로 가나안땅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. 레위인은 그곳에 머물기를 거부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올라가 베냐민 땅 기브아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.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 한명이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. 여기서 머뭇거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. 그 말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.
그 마을의 실체가 22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드러납니다. 그 밤에 노인의 집 밖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.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집에 온 그 남자를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. 그때 이 노인이 용감하게도 밖에 나갑니다. 23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. 하나는 이것은 악행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집에 온 손님이라는 것입니다. 그 노인은 이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며 또한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말합니다. 24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 레위인 대신에 내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25절에 보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냅니다. 그리고 새벽에야 놓아줍니다.
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의 문제입니다. 그들은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의 문화와 삶 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생각, 성품, 말, 행동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이 세상의 영향아래 놓여지게 됩니다. 그러면 오히려 엉망인 삶을 살게 됩니다.